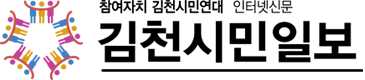홈
칼럼·기고
홈
칼럼·기고
“왜 인상을 하시려는 겁니까?” – 체육회 회비 인상 해프닝을 돌아보며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다. 당시 체육회의 회장은 김충섭 김천시장이었고 담당과장은 도 모씨였으며 김천시 체육회 이사로 위촉되었다며 첫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난 별 생각 없이 그 자리에 갔다.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하게 되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회의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이상했다.
안건 중 하나가 ‘체육회 부회장 및 이사 회비 인상’이었다. 기존 회비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고개가 갸웃해졌다. 나는 손을 들고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혹시 회비를 인상하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몇 명이 머뭇머뭇거리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건… 뭐… 아직 구체적인 건...”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작년에 50만 원씩 걷은 회비가 부족했나요?”
“아니요,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올해는 새로 기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회비를 두 배로 늘릴 정도면 뭔가 큰 변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번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사람들, 책상만 바라보는 사람들. 뭔가 이상한 회의였다. 안건은 올라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회의.
나는 말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회비 인상 안건은 보류합시다. 답이 없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그때 느꼈다. 이 자리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통과의 공간, 곧 ‘예스맨 확인의 자리’였다는 것을. 결국 난 그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체육회 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만 필요했던 모양이었다.
웃픈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다른 안건 중 하나는 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역시 졸속으로 처리됐다. 말로는 민주주의, 형식은 절차, 하지만 속은 전부 다 결정해놓고 겉치레로 회의하는 ‘쇼’였던 셈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 김충섭 시장과 대립했느냐”고. 나는 단순하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 회비를 두 배로 올리면서도 이유 하나 말 못하는 체육회, 선거인단을 구성하면서도 투명하지 못한 절차, 이게 진정 시민을 위한 조직인가?
진짜 회의는 ‘왜?’라고 묻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진짜 민주주의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날의 나는, 그 질문을 했다.
“왜 인상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 질문 하나로 나는 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지금도 그 질문은 하고 싶다.
시민의 자리에서, 권력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