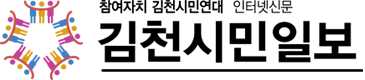홈
칼럼·기고
홈
칼럼·기고
[논설 칼럼] 인구감소 시대, 아이들을 위한 선택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인구 감소는 기정사실, 대응은 선택의 문제
-어른들의 ‘자리’보다 아이들의 ‘자리’를 생각하자
-기득권의 벽, 아이들을 가로막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유효하다. 자식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감행한 어머니의 이야기. 이 고사에서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은 단지 ‘교육열’이 아니다. 아이의 성장 환경을 위한 ‘결단’과 ‘책임’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지역 인구감소의 현실은, 바로 이 결단과 책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89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군 단위 지역은 교육, 의료, 교통 등의 기본 인프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학생 수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초등학교, 학년별로 친구가 한두 명밖에 없는 중학교. 외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교육적으로는 ‘고립된 섬’이 되고 있다.
기득권의 벽, 아이들을 가로막다
행정당국이 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나 기관의 통폐합을 시도하면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기득권의 저항'이다. 지역 교육청의 한 사례를 보자. A군의 한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이 8명에 불과했지만,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 인력은 유지되고 있었다. 교육청은 인근 중심지 학교로 통합을 추진했으나, 지역 유지들과 일부 학부모,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관리자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결국,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친구도 선배도 없는 외딴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공서, 금융기관, 보건소 등 모든 공공 인프라가 인구 감소에 따라 ‘비효율’의 경계에 놓인다. 하지만 통폐합을 말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반발이다. 그 결과, 중복되는 행정조직과 텅 빈 시설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어른들의 ‘자리’보다 아이들의 ‘자리’를 생각하자
누구도 자신의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교장 자리를 지키고 싶고, 지역 유지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다. 하지만 그 욕심이 결국 누구의 미래를 망치는가? 바로 아이들이다. 교육은 단지 책상과 의자, 교과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성도 발달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정보와 환경도 공동체 속에서 가능하다.
지방의 한 통폐합 사례를 소개한다. 전라남도 H시에서는 5개의 소규모 초등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숙사 형태의 통학형 캠퍼스를 운영했다. 통학이 어려운 농산촌 지역 아이들을 위해 전담 차량을 운영하고, 통합된 학교에는 도서관, 체육관, 진로체험실 등 대도시 못지않은 시설을 갖췄다. 결과는? 학부모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아이들의 사회성 모두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어른들의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구 감소는 기정사실, 대응은 선택의 문제
인구 1만 명 이하의 지역은 이제 공공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 금융기관은 수익성 문제로 문을 닫고, 우체국과 보건소도 점차 인근 지역으로 통폐합되고 있다.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 통폐합도, 행정기관 개편도 ‘불가피한 아픔’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한 조정이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른들의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리다.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지 부모의 책임이 아니다. 공동체 전체의 몫이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보다 나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아이들이 기댈 언덕을 빼앗지 말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어른이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는 용기다. 그 용기가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