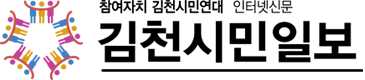홈
칼럼·기고
홈
칼럼·기고
"꽃은 바람에 흔들려야 뿌리를 내린다"
-꽃은 바람을 만나야 더 강해진다. 꽃잎은 바람에 젖지만, 뿌리는 더 깊어진다.
-이제는 깨닫는다. 사랑은 때로 시련을 허락하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냥 사랑만 해주면 안 되나요? 왜 일부러 힘들게 만들어야 하죠?”
어느 젊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묻자, 노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사랑하니까 힘들게 해야지요. 너무 사랑하면 바보로 자라요.”
그 말이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다. 왜 사랑하는데 힘들게 해야 하는가? 부모란,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고, 넘어질까 봐 항상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 아닌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내 아이가 인생이라는 험한 파도를 마주했을 때, 그 말이 가슴에 박히듯 떠올랐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했다.
부모로선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한 일이었다. 좋은 월급, 안정된 직장, 여유 있는 삶.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은 그만두었다.
팀장의 꾸지람 한마디에 좌절하고, 야근 몇 번에 병이 난 듯 지쳐버렸다.
다시 입사를 준비하겠다는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고생은 좀 해봤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 눈엔 너무 소중해서, 늘 따뜻한 방 안에, 좋은 음식만 주고, 힘든 일은 건너뛰게 해줬다.
혹여 친구에게 상처라도 받으면, 먼저 전화를 걸어 아이의 입장을 변호해줬고, 시험에서 실망하면 과외를 붙였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결국 자기 두 발로 서야 하고, 때로는 무너졌다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단단해지고, 감사함도 피어난다.
옛날 시골에서 자란 나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우유급식도 못 받았다.
가난했고, 도시 친구들에 비하면 창피한 구두를 신고 다녔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겪으며 배운 건,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공부도, 인간관계도,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리고 지금, 아이에게도 그런 ‘작은 겨울’을 일부러라도 안겨주고 싶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추위, 젖지 않을 만큼의 비바람을 겪게 해주고 싶다.
스스로 극복한 시련은 살아가며 마주할 더 큰 위기 앞에 방패가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버텨본 경험은 자신감이 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는 완벽한 울타리 속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며 뿌리를 내리는 꽃이어야 한다.”
그 꽃은 바람을 만나야 더 강해진다. 꽃잎은 바람에 젖지만, 뿌리는 더 깊어진다.
결국 삶의 폭풍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작은 풍랑을 받아들이며 자란 아이였다.
이제는 깨닫는다. 사랑은 때로 시련을 허락하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슴 아파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건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